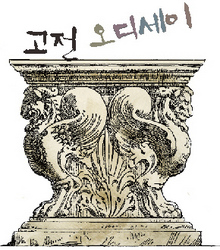고전 오디세이 ⑫ 시민을 짓밟은 권력자가 맞는 비극적 파멸
| 시민을 짓밟은 권력자가 맞는 비극적 파멸 | |
| 고전 오디세이 ⑫ ‘안티고네’의 진짜 주인공 크레온 | |
 |
 고명섭 기자 고명섭 기자  |
‘불복종이 최고악’이라는 오만한 왕 크레온. ‘국가는 시민의 것’이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아들의 충고를 외면한 그는 결국 아들과 아내의 자살을 목도하고 회한한다. “이 못난 인간을 지하세계로…”
크레온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다. 오이디푸스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서양문학사에서 가끔 언급되는 인물이다. 이 남자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안티고네라는 어린 조카와 벌인 말다툼 덕분이었다. 다툼의 발단은 이렇다. 오이디푸스가 왕좌에서 물러나자, 그의 두 아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진다. 이들은 골육상잔의 전쟁 끝에 테바이의 성문 앞에서 벌어진 일대일 전투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다. 덕분에 크레온은 테바이의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한다. 그는 폴리네이케스가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조국 테바이를 공격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매장과 장례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한다.(이하 작품 인용은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아무도 그를 위해 장례를 치르거나 애도하지 말고,/ 그의 시신을 묻지 말고 버려두어 새 떼와 개 떼의/ 밥이 되고 흉측한 몰골이 되게 하라고 하라. (크레온의 발언 204~206행)
크레온의 명령은 냉정하고 잔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명령은 설득력이 있다. 이는 사인(私人)이 아니라 공인(公人)으로서, 요컨대 국가의 통치자로서 당연히 내려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조국보다 친구를 우선시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시민들에게 안녕이 아니라 파멸을 가져다주는 자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국의 적을 친구로 맞아서는 안 된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조국이고,/ 조국이 안전하게 항해해야,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라를 통치하고 발전시키는 나의 원칙이다. (크레온의 대사, 181~190행)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포고령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이 개인의 이익과 권리에 우선한다는 논리와 특히 조국을 배반한 자를 용서하고 그런 자를 돌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듣는 사람을 위엄과 권위로써 압도하고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도 안티고네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반박한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크레온)의 포고령이/ 신들의 영원한 불문율(不文律)보다는/ 강력하지는 않소이다. (안티고네의 대사, 454~456행)
인용문은 한낱 개인에 불과한 안티고네가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신의 매장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크레온의 포고령을 한낱 인간의 자의적 의지에 토대를 둔 명령 정도로 폄하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에 크레온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불복종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불복종은/ 도시를 파괴하고, 집들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중략)/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종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법./ 하니 우리는 법질서를 옹호해야 하고,/ 한낱 계집애에게 져서는 안 된다. (673~678행)
오늘날에도 자주 듣는 주장이다. 크레온의 발언을 통해서 안티고네는 이제 실정법을 위반한 단순 범죄자가 아니게 된다. 안티고네는 국가 체제와 법질서를 유린하고 모독하는 이른바 ‘반체제’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드라마는 안티고네를 극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개별 시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아마도 최초의 사건은 이렇게 국가의 승리로 종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마가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크레온의 아들이지만, 안티고네의 애인이었던 하이몬이 등장해서 애인을 구명하기 위해 아버지와 본격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설득을 시도하는 아들의 말이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 말씀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모두 틀렸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은 마음속에 품지 마시길. (705~706행)
하이몬의 설득 논리가 흥미롭다. 요컨대 아버지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라고 촉구한다. 이에 크레온은 진노하고, 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은 절정에 도달한다.
크레온: 이 나라를 나의 뜻이 아닌 남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하이몬: 한 사람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지요.
크레온: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곧 국가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냐?
하이몬: 사막이라면 그렇겠지요. (중략)
크레온: 이 천하의 못된 놈, 감히 아버지에게 덤벼들다니! (736~742행)
공방은 더 이상 부자간의 말다툼이 아니다. 실은 이는 국가 권력과 개별 시민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이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크레온은 ‘자신이 곧 국가’ 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천하의 못된 놈”인 하이몬은, 그것은 “사막”에서나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국가 통치와 권력에 대한 크레온의 입장은 견고하다.
국가(폴리스)가 임명한 자가 명령하면 크고 작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크레온의 대사, 666~667행)
흥미로운 점은 ‘국가를 통치하는 자와 국가의 주인은 다르다’고 보는 하이몬의 입장에 대해서 크레온도 실은 자신의 권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것의 주인은 국가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국가가 임명한 자”라는 점을 크레온도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자신을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크레온의 착각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종류의 착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적 과오(hamartia)라 부른다.
하마르티아란 원래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어떤 착각 내지 착오로 인해 던진 말 한마디가 혹은 작은 행위 하나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고, 그 결과는 소위 비극적 파국과 파멸로 이끄는 잘못을 말한다. 요컨대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위가 무슨 뜻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행위나 잘못 일반이 하마르티아이다.
이런 의미에서 <안티고네>의 주인공은 안티고네가 아니고, 크레온이다. 안티고네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말해, 오빠를 매장하는 일이 곧 자신의 죽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데 반해, 크레온은 자신의 결정이 어떤 파국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모르고 행하기 때문이다.
잠시, 크레온에게 닥친 파국을 소개하면 이렇다. 크레온의 극형 선고를 받은 안티고네는 석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애인의 죽음에 분노한 하이몬은 아버지 크레온을 석굴에서 칼로 찌르려다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비탄에 빠져 궁정으로 돌아온 크레온에게, 아들 하이몬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한 아내 에우리디케가 자살했다는 비보가 전해진다. 이에 대한 크레온의 마지막 회한이다.
“지하 세계로 나를 데려가 다오. 이 못난 인간을!” (1339행)
비극적 파국을 겪으면서 자신을 마치 국가 자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자신이 한낱 “못난 인간”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그리스 비극은 대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권력의 정상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절정에서 패배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곳에서 끝난다. <안티고네>도 “인간은 겪고 나서 깨닫는다”(pathei mathos)라는 말과 함께 막을 내린다. 대체로 이렇게 끝나기에 그리스 비극 작품들은 조금 무겁다. 그럼에도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하련다. 겪고 나서, 당하고 나서 깨닫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크레온이라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크레온일지도 모르기에.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
| 기사등록 : 2010-08-13 오후 07:41:50 |
|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