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6. 13:58ㆍsensitivity
| “사회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인권개념 재구성 | |
| 새 패러다임 제시한 ‘인권의 대전환’ | |
 |
 이세영 기자 이세영 기자  |
|
출간 시기가 더없이 적절하다. 샌드라 프레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쓴 <인권의 대전환>(교양인)이다. 2008년 영국에서 출간된 직후 “인권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책”이라 평가받았다. 책을 옮긴 조효제(사진) 성공회대 교수는 “인권 개념을 재구성해 그동안 부차적·파생적 권리로 간주돼 온 사회·경제적 권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소개한다. 인권을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과 사회권(사회적·경제적 권리)로 구분하면서 앞의 권리에 역사적·논리적 우선권을 둬온 기존의 인권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권리에 관한 논의에 새 지평을 열어준다는 얘기다.
자유권 침범 않는 소극적 국가 넘어 프레드먼 명저…조효제 교수 번역
사회·경제 권리 위해 ‘적극 개입’ 주장
“용산사건 재판부가 이 책 읽었으면”
|
||||||
책은 권리 개념에 동반되는 국가의 의무 개념을 도출한 뒤, 이를 다시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로 구분한다. 소극적 의무가 개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자기 억제)이라면, 적극적 의무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 의무가 전통적인 자유권과 짝을 이룬 것이라면, 적극적 의무는 사회권에 대응하는데, 핵심은 이 두 가지 의무가 현실에서 결코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촛불집회를 예로 들어보자.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광장을 열라, 때리지 말라 요구하는 건 자유권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또는 신체의 장애 때문에 못 나오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다.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소리칠 기력과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이것을 보장하는 게 사회권이다. 옮긴이 조효제 교수의 설명이다.
|
||||||
조효제 교수는 “이 책은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숙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양심과 법에 의거해 초연하게 판결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는 양심적 판사들, 특히 방송법 권한쟁의 소송을 다룰 헌법재판소와 용산사건의 재판부가 이 책을 읽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
기사등록 : 2009-10-15 오후 06:39:44 |
| ⓒ 한겨레 (http://www.hani.co.kr). |
'sensitiv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절망의 공간에서 희망을 얘기한다고 그것이 무엇이 위안이겠는가? (0) | 2009.11.03 |
|---|---|
| [패션사진의 살아있는 신화 사라문] 패션사진 공모전 (0) | 2009.11.01 |
| [추석 연휴 다음날의 단상] 힘겨운 일상에서 연대의 밀알을 (0) | 2009.10.05 |
| 소설가 김별아의 '생애전환기 검사'라는 칼럼을 읽고 (0) | 2009.09.30 |
| [큐레이터가 말하는 사라문 특별전] 사진마법: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쉼표 (0) | 2009.09.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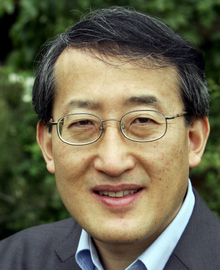

 기사수정 : 2009-10-15 오후 10:24:46
기사수정 : 2009-10-15 오후 10:24:46